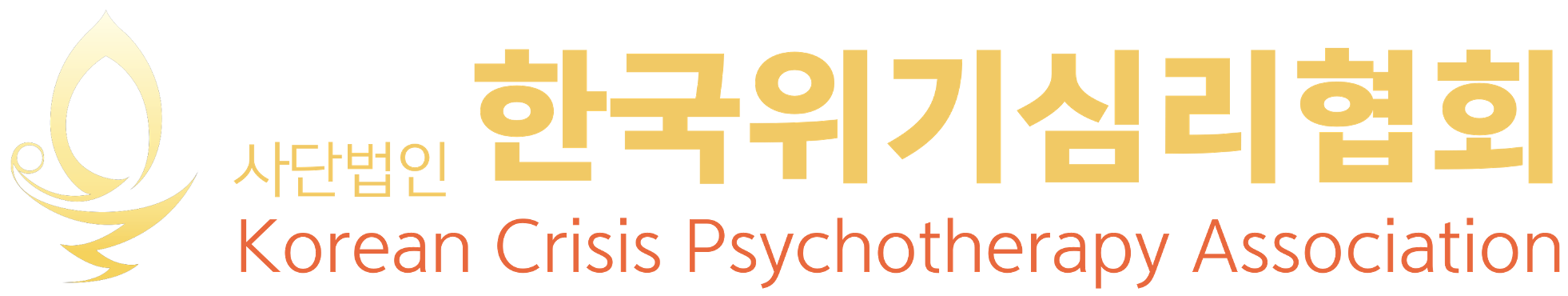자살 시도하려는 이에게 ‘자살 이유’ 물어도 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83회
작성일 2025-10-28 15:11
본문
[위기의 곁에서]上
자살 시도를 할 위험이 있는 사람을 만났다면,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간 다음 삶의 어떤 어려움이 자살을 고려하게 만들었는지 차분히 물어보는 것이 좋다.
삶이 버거워 자살을 택한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 연락하곤 한다. 그러나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9 전화 응답률이 2023년 55.7%에서 올해 상반기 49%까지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저녁 7시에서 밤 10시 사이 응답률은 36%에 머물러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동안 1393, 정신 건강 상담 전화, 청소년 전화, 여성 긴급 전화 등으로 분산됐던 자살 예방 상담이 작년 1월부터 109로 통합됐고, 이에 인력이 부족해진 탓이다.
자살 충동을 느끼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직전의 순간. 즉각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가 한 사람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인간 심리와 정신 건강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자살 위기에 놓인 사람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자살 예방 상담 전화나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또는 심리 상담 센터의 도움을 곧바로 받지 못할 상황일 때, 사람 대 사람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떤 말부터 걸어야 할까?
우선, 왜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왜 힘든지 직접적으로 물어본다. ‘자살’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이 자살 충동을 부추기는 것이 아닐까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자살’이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자살 위기에 있는 당사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미 상대방이 일부분 언급했고, 이것이 속마음을 털어놓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육성필 교수(자살 예방, 위기 관리 상담 전문)는 “자살을 고려하는지 누군가가 물어봐 주기만 해도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안도감을 느끼는 동시에 상대에게 신뢰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당사자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까봐 ‘진정되면 나중에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묻는 게 더 좋다. 육성필 교수는 “자살 위기는 불쑥 찾아왔다가 이내 잦아드는 특성이 있어서, 위기가 찾아온 그 순간이 지나간 후에 당사자에게 ‘자살 생각이 드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니다’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묻기를 미뤘다가 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다만, 질문은 사려 깊게 해야 한다. 동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사공정규 교수(한국생명운동연대 공동대표)는 “자살을 생각한 이유를 직접적으로 물을 필요가 있지만, 심문하려 들면 안 된다”며 “상대와 조용한 환경으로 이동한 다음, 침착한 상황에서 열린 질문으로 말문을 떼라”고 조언했다. 사공정규 교수는 ▲자살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드나요 ▲구체적으로 생각해둔 방법, 때, 장소가 있나요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나요 ▲상담이나 치료가 도움되었나요, 혹 아쉬웠던 점이 있나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보길 권했다.
자살 위기자의 대답에 반응은 어떻게?
당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해결책을 제시하려 들지 말고 일단 들어야 한다. 사공정규 교수는 “조언보다 ‘그래서 힘들었구나’ ‘말해 줘서 고맙다’ 같이 공감하는 말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다만, 자살에 쓸 수 있는 수단이 당사자 주변에 있다면 치우고, 보호자 또는 전문가에게 당사자를 연결하는 등의 조치는 취해야 한다. 위기 당사자에게 “지금 당신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자살 수단 치우기, 함께 있기, 보호자 연락하기 등)을 함께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처럼 제안하며 시도한다. 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살 위기 당사자가 가장 잘 안다. 육성필 교수는 “듣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말고, ‘내가 듣기로 당신은 ~한 일로 힘들어서 자살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다른 방식으로 힘듦을 해소하거나 완화한 적이 있었는가’를 물어서 당사자가 자살 이외 다른 해결책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말했다.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 상담 센터 방문을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공정규 교수와 육성필 교수는 모두 ‘꼭 가 보라’고 강요하는 말투보다는 ‘당신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해줘서 고맙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기관을 알고 있는데, 괜찮으면 연결해주고 싶다. 내일 내가 다시 연락할 테니 그때까지 같이 버티자’는 식으로 접근하길 권했다. 상담 센터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곳까지 직접 동행해주는 것이 좋다. 관련 기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서 ‘나중에 연락해 보라’고만 하면, 추후 자살 사고가 잦아들었을 때 당사자는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사공정규 교수는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강요로 느끼지 않도록 ‘원하시면 함께 가 드릴게요’ ‘함께 가 보는 건 어떨까요?’같은 표현을 택해서 주도권을 상대가 갖고 있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사자가 대화를 거부한다면?
왜 자살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물었는데, 상대방이 묵묵부답이라면 어떡할까. 사공정규 교수는 “억지로 대답을 끌어내려 하면 안 된다”며 “‘당장 말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나는 당신 곁에 있을 것이고, 당신이 말하면 들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만 전달하라”고 말했다. 육성필 교수는 “속내를 털어놓기를 주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당신이 말하면 언제든 든겠다는 신호를 주면서 곁에 머물기만 해도 ‘이 사람은 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구나’ 라는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곁에 있으라는 게 반드시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실제 상황에서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일이 여의치 않다면 ‘당신이 나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무언가 얘기하고 싶어진다면 나는 언제든지 응답하겠다. 그리고 당신에게 내 역량 바깥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보다 유능한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도 해당된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은?
당사자의 문제를 자의적 판단으로 축소하거나, 가르치려 들거나, 섣불리 충고 또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당사자가 주도권 또는 선택권을 빼앗겼다고 여길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모두 금지다. 당사자가 왜 자살하고 싶은지 털어놓았대서 당신이 그의 인생을 낱낱이 아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에겐 아무렇지 않은 일이 타인에겐 죽음을 고려할 만큼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다. ▲너보다 더 힘든 일 겪은 사람도 있어 ▲그 정도 일로 죽으면 안 돼 ▲너는 강하니까 잘 버틸 수 있을 거야 등의 말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으니 하지 말아야 한다.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고통의 크기를 축소하는 말로 들리고, 나를 이해하는 이가 없다는 생각에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 수 있다. 육성필 교수는 “나는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떤 상황에 부닥쳤는지 잘 모르지만,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 내가 도울 수 있게 당신이 이야기를 들려달라’라는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살하지 않겠다고 나와 약속하자 ▲절대 자살하면 안 된다 등과 같이 약속을 강요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 금지다.
자신에게도 힘든 경험이 있었다면, 이것을 공유하며 당사자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정도는 괜찮다. 사공정규 교수는 “그러나 내가 겪은 고통과 그 사람이 겪은 고통을 비교해, ‘당신의 고통은 내가 겪은 것에 비하면 사소하다’라고 판단하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육성필 교수는 “자신의 경험은 ‘나는 힘들었을 때 이런 도움을 받아서 위기에서 벗어났던 적이 있는데, 어쩌면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안하는 정도로만 활용하라”고 말했다.
인간적 위로를 주고 싶다는 생각에 섣불리 포옹 같은 스킨십을 하는 것도 금물이다. 친구, 가족 등 이미 친분이 두텁고 신뢰 관계가 강한 사이라면 짧고 안정적인 포옹이 도움될 수 있다. 그러나 교사나 상급자 등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불쾌감을 줄 수 있다. 게다가 상대방이 나와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라면 스킨십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해석이 다를 가능성도 있다. 사공정규 교수와 육성필 교수 모두 “상대의 신체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해림 기자 lhr@chosun.com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346/0000099341
자살 시도를 할 위험이 있는 사람을 만났다면,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간 다음 삶의 어떤 어려움이 자살을 고려하게 만들었는지 차분히 물어보는 것이 좋다.
삶이 버거워 자살을 택한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 연락하곤 한다. 그러나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9 전화 응답률이 2023년 55.7%에서 올해 상반기 49%까지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저녁 7시에서 밤 10시 사이 응답률은 36%에 머물러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동안 1393, 정신 건강 상담 전화, 청소년 전화, 여성 긴급 전화 등으로 분산됐던 자살 예방 상담이 작년 1월부터 109로 통합됐고, 이에 인력이 부족해진 탓이다.
자살 충동을 느끼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직전의 순간. 즉각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가 한 사람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인간 심리와 정신 건강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자살 위기에 놓인 사람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자살 예방 상담 전화나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또는 심리 상담 센터의 도움을 곧바로 받지 못할 상황일 때, 사람 대 사람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떤 말부터 걸어야 할까?
우선, 왜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왜 힘든지 직접적으로 물어본다. ‘자살’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이 자살 충동을 부추기는 것이 아닐까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자살’이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자살 위기에 있는 당사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미 상대방이 일부분 언급했고, 이것이 속마음을 털어놓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육성필 교수(자살 예방, 위기 관리 상담 전문)는 “자살을 고려하는지 누군가가 물어봐 주기만 해도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안도감을 느끼는 동시에 상대에게 신뢰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당사자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까봐 ‘진정되면 나중에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묻는 게 더 좋다. 육성필 교수는 “자살 위기는 불쑥 찾아왔다가 이내 잦아드는 특성이 있어서, 위기가 찾아온 그 순간이 지나간 후에 당사자에게 ‘자살 생각이 드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니다’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묻기를 미뤘다가 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다만, 질문은 사려 깊게 해야 한다. 동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사공정규 교수(한국생명운동연대 공동대표)는 “자살을 생각한 이유를 직접적으로 물을 필요가 있지만, 심문하려 들면 안 된다”며 “상대와 조용한 환경으로 이동한 다음, 침착한 상황에서 열린 질문으로 말문을 떼라”고 조언했다. 사공정규 교수는 ▲자살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드나요 ▲구체적으로 생각해둔 방법, 때, 장소가 있나요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나요 ▲상담이나 치료가 도움되었나요, 혹 아쉬웠던 점이 있나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보길 권했다.
자살 위기자의 대답에 반응은 어떻게?
당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해결책을 제시하려 들지 말고 일단 들어야 한다. 사공정규 교수는 “조언보다 ‘그래서 힘들었구나’ ‘말해 줘서 고맙다’ 같이 공감하는 말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다만, 자살에 쓸 수 있는 수단이 당사자 주변에 있다면 치우고, 보호자 또는 전문가에게 당사자를 연결하는 등의 조치는 취해야 한다. 위기 당사자에게 “지금 당신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자살 수단 치우기, 함께 있기, 보호자 연락하기 등)을 함께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처럼 제안하며 시도한다. 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살 위기 당사자가 가장 잘 안다. 육성필 교수는 “듣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말고, ‘내가 듣기로 당신은 ~한 일로 힘들어서 자살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다른 방식으로 힘듦을 해소하거나 완화한 적이 있었는가’를 물어서 당사자가 자살 이외 다른 해결책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말했다.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 상담 센터 방문을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공정규 교수와 육성필 교수는 모두 ‘꼭 가 보라’고 강요하는 말투보다는 ‘당신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해줘서 고맙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기관을 알고 있는데, 괜찮으면 연결해주고 싶다. 내일 내가 다시 연락할 테니 그때까지 같이 버티자’는 식으로 접근하길 권했다. 상담 센터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곳까지 직접 동행해주는 것이 좋다. 관련 기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서 ‘나중에 연락해 보라’고만 하면, 추후 자살 사고가 잦아들었을 때 당사자는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사공정규 교수는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강요로 느끼지 않도록 ‘원하시면 함께 가 드릴게요’ ‘함께 가 보는 건 어떨까요?’같은 표현을 택해서 주도권을 상대가 갖고 있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사자가 대화를 거부한다면?
왜 자살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물었는데, 상대방이 묵묵부답이라면 어떡할까. 사공정규 교수는 “억지로 대답을 끌어내려 하면 안 된다”며 “‘당장 말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나는 당신 곁에 있을 것이고, 당신이 말하면 들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만 전달하라”고 말했다. 육성필 교수는 “속내를 털어놓기를 주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당신이 말하면 언제든 든겠다는 신호를 주면서 곁에 머물기만 해도 ‘이 사람은 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구나’ 라는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곁에 있으라는 게 반드시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실제 상황에서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일이 여의치 않다면 ‘당신이 나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무언가 얘기하고 싶어진다면 나는 언제든지 응답하겠다. 그리고 당신에게 내 역량 바깥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보다 유능한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도 해당된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은?
당사자의 문제를 자의적 판단으로 축소하거나, 가르치려 들거나, 섣불리 충고 또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당사자가 주도권 또는 선택권을 빼앗겼다고 여길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모두 금지다. 당사자가 왜 자살하고 싶은지 털어놓았대서 당신이 그의 인생을 낱낱이 아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에겐 아무렇지 않은 일이 타인에겐 죽음을 고려할 만큼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다. ▲너보다 더 힘든 일 겪은 사람도 있어 ▲그 정도 일로 죽으면 안 돼 ▲너는 강하니까 잘 버틸 수 있을 거야 등의 말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으니 하지 말아야 한다.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고통의 크기를 축소하는 말로 들리고, 나를 이해하는 이가 없다는 생각에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 수 있다. 육성필 교수는 “나는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떤 상황에 부닥쳤는지 잘 모르지만,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 내가 도울 수 있게 당신이 이야기를 들려달라’라는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살하지 않겠다고 나와 약속하자 ▲절대 자살하면 안 된다 등과 같이 약속을 강요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 금지다.
자신에게도 힘든 경험이 있었다면, 이것을 공유하며 당사자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정도는 괜찮다. 사공정규 교수는 “그러나 내가 겪은 고통과 그 사람이 겪은 고통을 비교해, ‘당신의 고통은 내가 겪은 것에 비하면 사소하다’라고 판단하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육성필 교수는 “자신의 경험은 ‘나는 힘들었을 때 이런 도움을 받아서 위기에서 벗어났던 적이 있는데, 어쩌면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안하는 정도로만 활용하라”고 말했다.
인간적 위로를 주고 싶다는 생각에 섣불리 포옹 같은 스킨십을 하는 것도 금물이다. 친구, 가족 등 이미 친분이 두텁고 신뢰 관계가 강한 사이라면 짧고 안정적인 포옹이 도움될 수 있다. 그러나 교사나 상급자 등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불쾌감을 줄 수 있다. 게다가 상대방이 나와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라면 스킨십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해석이 다를 가능성도 있다. 사공정규 교수와 육성필 교수 모두 “상대의 신체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해림 기자 lhr@chosun.com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346/0000099341
- 이전글한국위기심리협회, '위기실무 중급워크숍' 성료... 현장 적용력 강화 입증 25.11.25
- 다음글육성필 협회장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 25.09.17